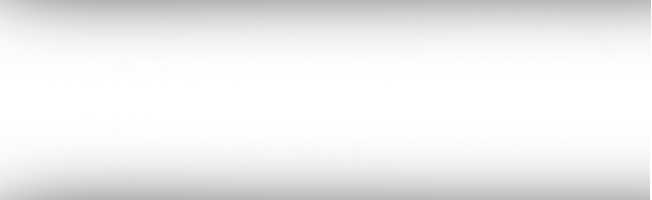내 손이 따뜻할 때
내 삶도 따뜻하다.
내 마음이 설레일 때
내 삶도 설레인다.
내 얼굴에 표정이 살아 있을 때
내 삶도 살아있다.
요즘 들어 차가워진 제 손을 보며 용혜원님의 시귀詩句를 적어보았습니다.
제 손도 다시 따뜻해졌으면 해서요.
윤대녕님의 '그녀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이라는 제목의 산문집이 있습니다.
부활절 행사로 모두 교회에서 지내는 바람에 저 혼자 남은 집에서 읽은 책입니다.
구입은 오래 전에 구입하였는데, 제목이 저를 심란心亂하게 해서 저만치 미루어 놓았던 책입니다.
그런데 어인 일인지... 내용이 궁금해서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 읽어보았습니다.
느낌은... 느낌보다는 본문의 일부를 적어보겠습니다.
열대 정원으로부터(소제목)
쏟아지는 비를 피해 찾아갔던 짧은 처마 밑에서 아슬아슬하게
등 붙이고 서 있던 여름날 밤을 나는 얼마나 아파했는지
체념처럼 땅바닥에 떨어져 이리저리 낮게만 흘러 다니는 빗물을 보며
당신을 생각했는지. 빗물이 파놓은 깊은 골이 어쩌면 당신이었는지
칠월의 밤은 또 얼마나 많이 흘러 가버렸는지.
땅바닥을 구르던 내 눈물은 지옥 같았던 내 눈물은 왜 아직도 내 곁에 있는지
칠월의 길엔 언제나 내 체념이 있고 이름조차 잃어버린 흑백영화가 있고
빗물에 쓸려 어디론가 가버린 잊은 그대가 있었다.
여름날 나는 늘 천국이 아니고 칠월의 나는 체념뿐이어도 좋을 것
모두 다 절망하듯 쏟아지는 세상의 모든 빗물. 내가 여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허연이란 시인이 쓴 '7월'이란 시입니다. 당신을 만나기 불과 하루 전까지 나는 머나먼 열대에 있었습니다. 날짜 변경선이 도대체 어디에 걸려 있는지 모를 그 후텁한 슬픔의 열대. 떠나오기 전날 밤 저 '7월'처럼 야자수 숲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랑을 잃고 또 사람을 잊고자 떠나온 열대였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필리핀의 보라카이와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파타야를 순례자처럼 맨발로 돌아다녔습니다. 급기야 얼굴에 화상을 입고 첫날 묵었던 발리의 첸다나 코티지로 돌아와 이틀을 꼬박 앓아 누워있었습니다. 쿠타 해변에서 웬 맨발의 여자에게서 산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열대 코티지(트로피컬 샬레)는 모두 대나무로 지어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뱀부 송 Bamboo Song>이란 노래까지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대나무 사이사이로 햇빛이 부챗살처럼 틈입해 들어와 침대를 그물처럼 덮습니다. 그 그물에 갇혀 꿈틀거리며 한 달을 열대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절망이란 빛조차도 그물이 된다는 걸 말입니다.
빛의 그물에 갇혀 누군가 정원을 지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열대의 밝은 햇빛. 문을 열면 바로 내다보이는 논바닥의 오리떼. 허리 굽은 노인네가 일 년 내내 소를 끌고 오리떼를 쫓으며 논바닥을 갈고 있습니다. 삶은 한편 그러한 것.
파타야로 떠나오기 전날 발리에서 석양이 가장 아름답다는 타냐롯에 지프를 타고 갔습니다. 절벽 위에 있는 야외 카페 흰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도미구이에 빈땅이란 맥주를 마시며 장엄한 일몰을 보았습니다.
절벽 아래엔 조그만 섬이 있고 거기 사원이 있습니다. 삼백 년 전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그곳에 지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밀물 때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해는 그 섬 너머로 아름답고 장엄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북아에서 온 한 우울한 사내의 묵은 사랑을 붉게 태워 없애며.
돌아온 밤에 줄기차게 비가 내렸습니다. 밖에 버려져 있는 열대 안락의자가 그 비에 젖고 있었습니다. 낮에 웬 아름다운 금발의 여자가 부신 살결을 드러내고 누워 있던 그 의자 위에. 열대에 내리는 비는 체념처럼 혹은 절망처럼 거칠게 쏟아부으며, 아픈 나를 밤새 씻어내며 먼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보니 비는 그쳐 있었고 어제 아침과 똑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논바닥의 오리떼. 끈적이는 진흙 속에서 소를 끌고 가는 노인네. 눈이 멀어버릴 듯한 햇빛. 그때 저는 몇 년 전 사막에 가서 본 햇빛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파타야 해변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마침 송크란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어서 구경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저마다 귀에 꽃을 꽂고 몸에다 서로 물을 뿌려주며 삶을 축복해주는 의식을 치르는 것을 보며 나 역시 다시 태어나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방콕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승무원 복장을 하고 승객에게 구명조끼 입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크린에서는 서울의 현재 시각과 날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약 여섯 시간 동안의 비행 동안 나는 안경 원숭이 같은 꼴을 하고 윈도 시트에 앉아 있었지요. 선글라스를 끼고 고행이라도 하듯 햇빛 속을 돌아다니다 보니 얼굴이 그렇게 고약하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과 나는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년 전 어느 비 내리던 날 저녁 광화문 거리를 혼자 걷고 있을 때였지요. 세종문화회관 앞을 지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얼결에 돌아보니 감색 스웨터에 청바지를 입은 당신이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몹시 당황한 얼굴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여 내게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그 날 인사동까지 걸어가 '산타페'라는 찻집에서 당신과 차를 한잔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그 날 당신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람은 한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묘한 만남이었고 밤 11시쯤 낙엽이 쓸려 다니고 있는 인사동 거리에서 당신과 나는 도로 멋쩍은 타인이 되어 헤어졌습니다. 물론 다시 만날 약속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듯 방콕-서울 간 비행기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비행기 승무원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요.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당신이 갖다준 사탕을 입으로 녹이며 빨간 담요를 쓰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깨워 일어나니 하늘은 캄캄했고 안경 원숭이에게 밥을 주러 당신이 또 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당신은 나를 알아보고 후후거리며 웃었습니다. 언젠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차를 마시고 헤어졌던 남자라는 것을.
비행기가 착륙하고 내릴 때가 되어 나는 출구에 서서 승객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는 당신 앞에 서서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뒤에는 손에 무거운 가방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당신은 아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서 나는 가방도 풀지 못한 채 샤워만 겨우 하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내 귀에는 아직도 열대 정원에서 따라온 빗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 주일 전 하이야트 호텔 바Bar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당신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줄곧 입을 다물고 있는 당신에게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지요.
"앞으로 생각나면 가끔 편지를 쓰겠습니다. 답장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저 쓰는 겁니다." 오늘은 신촌에 있는 '비바'라는 칵테일 바에 가서 혼자 마가리타를 세 잔 마시고 왔습니다. 하이야트에서 당신이 마시던 칵테일입니다. 의외로 독하더군요. 스피커에서는 마침 비지스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열대 안락의자에 앉아 당신과 그 노래를 듣고 싶군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방콕에 있든지 아니면 하늘에 떠 있든지 그러겠지요. 다시 쓰지요.
본문의 일부만 적어놓았는데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글은 모두 편지글 형식으로 31개의 산문이 나옵니다.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스튜어디스인 여성이면, 그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편지도 끝납니다.
글 속의 '작가'는 광화문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나 친구가 됩니다. 몇 번의 우연과 바람이 깃들인 암시가 오간 끝에 마침내 함께 여행을 다니게 된 그들... 작가는 그녀에게 심상하고 차분한 예의 그 문체로 편지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작가가 '그녀'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은 대개 여행의 일입니다. 원숭이처럼 얼굴을 새카맣게 태워먹은 동남아시아 여행이라든가, 일본 여행이라든가, 이런 저런 맛난 것들을 먹었던 바다로의 여행들(작가는 생선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책의 부제가 '윤대녕 여행 산문'인가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매력은 작가의 자유로운 글쓰기를 훔쳐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녀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이라니. 말하자면 우리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보았던 영화며, 점심에 먹었던 초밥이며, 한밤중에 일어나 들었던 천둥소리에 대해 두서 없이 늘어놓듯이,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한 귀에 목소리가 아득히 멉니다', '저 칼날 속의 너무 많은 꽃들, 어제 내가 생으로 죽여 먹은 바다 고기들'같은 노곤하게 아름다운 문장들로 말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엔 30번 도로 위에 있고 싶습니다.
그 길은 화엄의 길은 아니라도 분명 달콤한 여수의 길인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은희경의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中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친구 중에는 세상의 인연이 다 번뇌라며
강원도의 어느 절로 들어가다가,
시외버스 안에서 군인 옆자리에 앉게 되어
두 달만에 결혼한 애가 있다.
인연을 끊겠다는 사람일수록
마음 속에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강하다.
벗어나려고 하면서도 집착의 대상을 찾는 것이
인간이 견뎌야 할 고독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인연은 오묘하고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놀랍고 무섭습니다. 자신의 뜻과는 무관한 인연이 허다합니다. 맺고 싶다고 맺어지고, 끊겠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의 구절을 적으면서 다만 바라는 것은 '스타지우'에서의 저와 님들의 좋은 인연이 악연惡緣으로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뜰 해를 위해서 지금은 좀 쉬어야겠습니다.
솔직히 좀 허리가 아파요.
한 번 고생을 하니... 계속 이럽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데... 의사인 친구 말로는 '신경성'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프면 정작 본인이 제일 힘들지만, 지켜보는 사람의 심정도 말이 아니거든요.
대신 아플 수 없는 그 심정... 전 조금 알거든요.
그럼... 편한 밤 되세요.
내 삶도 따뜻하다.
내 마음이 설레일 때
내 삶도 설레인다.
내 얼굴에 표정이 살아 있을 때
내 삶도 살아있다.
요즘 들어 차가워진 제 손을 보며 용혜원님의 시귀詩句를 적어보았습니다.
제 손도 다시 따뜻해졌으면 해서요.
윤대녕님의 '그녀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이라는 제목의 산문집이 있습니다.
부활절 행사로 모두 교회에서 지내는 바람에 저 혼자 남은 집에서 읽은 책입니다.
구입은 오래 전에 구입하였는데, 제목이 저를 심란心亂하게 해서 저만치 미루어 놓았던 책입니다.
그런데 어인 일인지... 내용이 궁금해서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 읽어보았습니다.
느낌은... 느낌보다는 본문의 일부를 적어보겠습니다.
열대 정원으로부터(소제목)
쏟아지는 비를 피해 찾아갔던 짧은 처마 밑에서 아슬아슬하게
등 붙이고 서 있던 여름날 밤을 나는 얼마나 아파했는지
체념처럼 땅바닥에 떨어져 이리저리 낮게만 흘러 다니는 빗물을 보며
당신을 생각했는지. 빗물이 파놓은 깊은 골이 어쩌면 당신이었는지
칠월의 밤은 또 얼마나 많이 흘러 가버렸는지.
땅바닥을 구르던 내 눈물은 지옥 같았던 내 눈물은 왜 아직도 내 곁에 있는지
칠월의 길엔 언제나 내 체념이 있고 이름조차 잃어버린 흑백영화가 있고
빗물에 쓸려 어디론가 가버린 잊은 그대가 있었다.
여름날 나는 늘 천국이 아니고 칠월의 나는 체념뿐이어도 좋을 것
모두 다 절망하듯 쏟아지는 세상의 모든 빗물. 내가 여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허연이란 시인이 쓴 '7월'이란 시입니다. 당신을 만나기 불과 하루 전까지 나는 머나먼 열대에 있었습니다. 날짜 변경선이 도대체 어디에 걸려 있는지 모를 그 후텁한 슬픔의 열대. 떠나오기 전날 밤 저 '7월'처럼 야자수 숲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랑을 잃고 또 사람을 잊고자 떠나온 열대였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필리핀의 보라카이와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파타야를 순례자처럼 맨발로 돌아다녔습니다. 급기야 얼굴에 화상을 입고 첫날 묵었던 발리의 첸다나 코티지로 돌아와 이틀을 꼬박 앓아 누워있었습니다. 쿠타 해변에서 웬 맨발의 여자에게서 산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열대 코티지(트로피컬 샬레)는 모두 대나무로 지어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뱀부 송 Bamboo Song>이란 노래까지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대나무 사이사이로 햇빛이 부챗살처럼 틈입해 들어와 침대를 그물처럼 덮습니다. 그 그물에 갇혀 꿈틀거리며 한 달을 열대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절망이란 빛조차도 그물이 된다는 걸 말입니다.
빛의 그물에 갇혀 누군가 정원을 지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열대의 밝은 햇빛. 문을 열면 바로 내다보이는 논바닥의 오리떼. 허리 굽은 노인네가 일 년 내내 소를 끌고 오리떼를 쫓으며 논바닥을 갈고 있습니다. 삶은 한편 그러한 것.
파타야로 떠나오기 전날 발리에서 석양이 가장 아름답다는 타냐롯에 지프를 타고 갔습니다. 절벽 위에 있는 야외 카페 흰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도미구이에 빈땅이란 맥주를 마시며 장엄한 일몰을 보았습니다.
절벽 아래엔 조그만 섬이 있고 거기 사원이 있습니다. 삼백 년 전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그곳에 지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밀물 때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해는 그 섬 너머로 아름답고 장엄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북아에서 온 한 우울한 사내의 묵은 사랑을 붉게 태워 없애며.
돌아온 밤에 줄기차게 비가 내렸습니다. 밖에 버려져 있는 열대 안락의자가 그 비에 젖고 있었습니다. 낮에 웬 아름다운 금발의 여자가 부신 살결을 드러내고 누워 있던 그 의자 위에. 열대에 내리는 비는 체념처럼 혹은 절망처럼 거칠게 쏟아부으며, 아픈 나를 밤새 씻어내며 먼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보니 비는 그쳐 있었고 어제 아침과 똑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논바닥의 오리떼. 끈적이는 진흙 속에서 소를 끌고 가는 노인네. 눈이 멀어버릴 듯한 햇빛. 그때 저는 몇 년 전 사막에 가서 본 햇빛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파타야 해변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마침 송크란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어서 구경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저마다 귀에 꽃을 꽂고 몸에다 서로 물을 뿌려주며 삶을 축복해주는 의식을 치르는 것을 보며 나 역시 다시 태어나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방콕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승무원 복장을 하고 승객에게 구명조끼 입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크린에서는 서울의 현재 시각과 날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약 여섯 시간 동안의 비행 동안 나는 안경 원숭이 같은 꼴을 하고 윈도 시트에 앉아 있었지요. 선글라스를 끼고 고행이라도 하듯 햇빛 속을 돌아다니다 보니 얼굴이 그렇게 고약하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과 나는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년 전 어느 비 내리던 날 저녁 광화문 거리를 혼자 걷고 있을 때였지요. 세종문화회관 앞을 지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얼결에 돌아보니 감색 스웨터에 청바지를 입은 당신이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몹시 당황한 얼굴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여 내게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그 날 인사동까지 걸어가 '산타페'라는 찻집에서 당신과 차를 한잔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그 날 당신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람은 한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묘한 만남이었고 밤 11시쯤 낙엽이 쓸려 다니고 있는 인사동 거리에서 당신과 나는 도로 멋쩍은 타인이 되어 헤어졌습니다. 물론 다시 만날 약속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듯 방콕-서울 간 비행기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비행기 승무원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요.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당신이 갖다준 사탕을 입으로 녹이며 빨간 담요를 쓰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깨워 일어나니 하늘은 캄캄했고 안경 원숭이에게 밥을 주러 당신이 또 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당신은 나를 알아보고 후후거리며 웃었습니다. 언젠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차를 마시고 헤어졌던 남자라는 것을.
비행기가 착륙하고 내릴 때가 되어 나는 출구에 서서 승객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는 당신 앞에 서서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뒤에는 손에 무거운 가방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당신은 아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서 나는 가방도 풀지 못한 채 샤워만 겨우 하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내 귀에는 아직도 열대 정원에서 따라온 빗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 주일 전 하이야트 호텔 바Bar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당신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줄곧 입을 다물고 있는 당신에게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지요.
"앞으로 생각나면 가끔 편지를 쓰겠습니다. 답장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저 쓰는 겁니다." 오늘은 신촌에 있는 '비바'라는 칵테일 바에 가서 혼자 마가리타를 세 잔 마시고 왔습니다. 하이야트에서 당신이 마시던 칵테일입니다. 의외로 독하더군요. 스피커에서는 마침 비지스의
열대 안락의자에 앉아 당신과 그 노래를 듣고 싶군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방콕에 있든지 아니면 하늘에 떠 있든지 그러겠지요. 다시 쓰지요.
본문의 일부만 적어놓았는데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글은 모두 편지글 형식으로 31개의 산문이 나옵니다.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스튜어디스인 여성이면, 그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편지도 끝납니다.
글 속의 '작가'는 광화문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나 친구가 됩니다. 몇 번의 우연과 바람이 깃들인 암시가 오간 끝에 마침내 함께 여행을 다니게 된 그들... 작가는 그녀에게 심상하고 차분한 예의 그 문체로 편지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작가가 '그녀'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은 대개 여행의 일입니다. 원숭이처럼 얼굴을 새카맣게 태워먹은 동남아시아 여행이라든가, 일본 여행이라든가, 이런 저런 맛난 것들을 먹었던 바다로의 여행들(작가는 생선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책의 부제가 '윤대녕 여행 산문'인가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매력은 작가의 자유로운 글쓰기를 훔쳐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녀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이라니. 말하자면 우리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보았던 영화며, 점심에 먹었던 초밥이며, 한밤중에 일어나 들었던 천둥소리에 대해 두서 없이 늘어놓듯이,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한 귀에 목소리가 아득히 멉니다', '저 칼날 속의 너무 많은 꽃들, 어제 내가 생으로 죽여 먹은 바다 고기들'같은 노곤하게 아름다운 문장들로 말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엔 30번 도로 위에 있고 싶습니다.
그 길은 화엄의 길은 아니라도 분명 달콤한 여수의 길인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은희경의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中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친구 중에는 세상의 인연이 다 번뇌라며
강원도의 어느 절로 들어가다가,
시외버스 안에서 군인 옆자리에 앉게 되어
두 달만에 결혼한 애가 있다.
인연을 끊겠다는 사람일수록
마음 속에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강하다.
벗어나려고 하면서도 집착의 대상을 찾는 것이
인간이 견뎌야 할 고독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인연은 오묘하고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놀랍고 무섭습니다. 자신의 뜻과는 무관한 인연이 허다합니다. 맺고 싶다고 맺어지고, 끊겠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의 구절을 적으면서 다만 바라는 것은 '스타지우'에서의 저와 님들의 좋은 인연이 악연惡緣으로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뜰 해를 위해서 지금은 좀 쉬어야겠습니다.
솔직히 좀 허리가 아파요.
한 번 고생을 하니... 계속 이럽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데... 의사인 친구 말로는 '신경성'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프면 정작 본인이 제일 힘들지만, 지켜보는 사람의 심정도 말이 아니거든요.
대신 아플 수 없는 그 심정... 전 조금 알거든요.
그럼... 편한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