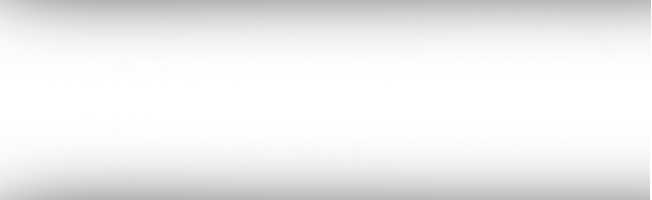자선이란 당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지도 모를 때 지키는 침묵이요.
당신의 이웃이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참아내는 인내요.
추문이 들릴 때 못 들은 척 귀를 막아버리는 일이요.
다른 사람의 재난에 동정을 베푸는 일이며,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을 미루지 않고 즉시 행하는 일이요.
불행이 닥치면 용기를 갖는 일이다.
구세군의 모금함도 그렇고, 산타Santa의 옷 색깔도 그렇고, 12월의 상징들은 대체로 붉은 것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연인들의 사랑은 핑크빛 소문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비해, 자선과 마지막이라는 말을 수만 번 듣게 되는 12월은 온통 붉은 것들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와 무엇을 나눈다는 것은 왜 붉게만 보일까요?
애절한 사랑도 겨우 핑크빛으로 보이는데....
그건, 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뼈아픈 후회와 처절한 눈물을 흘린 자만이 갖게 되는 핏빛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숨막히는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침묵과, 인내와 동정과 본분과 용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철환'의 <연탄길>시리즈를 읽다보면 마음을 찡하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와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반딧불이
가을바람이 우수수 낙엽을 몰고 다녔다. 은행나무의 긴 그림자가 교수실 안으로 해쓱한 얼굴을 디밀더니, 조롱조롱 얼굴을 맞댄 노란 은행잎들이 경화 눈에 정겹게 들어왔다. 경화는 기말고사 시험지를 채점하다말고 우두커니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신기루처럼 환한 대학시절의 추억들이 경화의 마음속으로 성큼 다가왔다. 모교의 교수가 된 경화에게 지난 기억들은 언제나 유쾌한 아픔이었다.
경화가 대학시절 퀭한 눈으로 중앙도서관을 오갈 때면 늘 마주치던 청소부 아줌마가 있었다. 몽당비만한 몸으로 이곳 저곳을 오가며 분주히 청소하던 아줌마. 개미떼 같은 기미가 앉은 아줌마의 얼굴엔 한겨울에도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청소부 아줌마를 만나면 경화는 항상 반가운 얼굴로 다가갔다.
"아줌마, 오늘도 또 만났네요. 아줌마도 반갑지요?"
"그럼요. 반갑고말고요."
"아줌마께 여쭤볼 게 있어요. 어떻게 아줌마 얼굴은 언제 봐도 맑게 개어 있지요?"
아줌마는 빙그레 웃으며 결린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거야, 희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대학 다니는 딸이 어찌나 착하고 열심히 공부하는지, 딸에만 생각하면 허리 아픈 것도 다 잊어 버려요."
"대학 다니는 딸은 얼굴이 예쁜가요?"
"그럼요. 예쁘고말구요."
"딸의 이름이 뭔데요?"
"이름은 경화구, 성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스꽝스런 대화를 주고받은 뒤, 두 모녀는 까르르 웃곤 했다. 청소부 아줌마는 바로 경화 어머니였다. 경화는 마음 아픈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청소하는 엄마를 만나면 늘 그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었다. 엄마를 대신해 걸레질을 할 순 없었지만, 열람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크고 작은 휴지들이 경화의 손에 언제나 가득했다.
대학시절을 회상하던 경화는 문득 시계를 봤다. 그리고 서둘러 교수연구실을 나섰다. 경화는 엄마가 있는 행정관 지하 보일러실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엄마는 비좁고 궁색한 방 한구석에서 낡은 수건을 줄에 널고 있었다.
"우리 딸, 아니 민 교수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그냥…."
"왜, 속상한 일이라도 있는 거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럼 다행이구. 근데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실은 엄마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경화는 허공에 시선을 둔 채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있잖아, 청소일 그만두면 안 돼?"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몸뚱이가 아직 성한데, 왜 일을 그만둬."
"엄마 나이도 있고, 허리도 무릎도 많이 아프잖아."
"나야, 이날까지 청소일로 이골이 났는걸 뭐. 하루 이틀 허리 아픈 것도 아니고. 허긴 네가 학생들 가르치는 대학에서 엄마가 청소일을 하는 게 창피스러울까 봐, 그 생각을 안 해본건 아냐. 너, 혹시 그래서 그러는 거냐?"
"그런 거 아냐. 엄마."
"그런 거 아니면 됐다."
경화는 속마음을 들켜버린 듯 엄마의 물음에 당황한 빛을 보였다. 사실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내에서 청소일을 하는 엄마가 경화의 마음엔 무거운 돌처럼 매달려 있었다.
"경화야, 엄마가 청소일 한 지 얼마나 됐는 줄 아니?"
"나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얼마나 된 걸까?"
"벌써 삼십 년이나 됐다. 너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내 뼈마디 마디를 다 묻은 곳을 떠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아파 누워 있는 어린 너를 방에 두고 새벽버스를 타고 나와야 하는 에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데…. 그런 날이면 하루종일 눈물만 닦으며 일한 적도 많았었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하는 엄마의 얼굴은 깊은 회한에 잠겨 있었다.
"이제는 엄마가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잖아. 엄마도 봉천동 집에 혼자 계시지 말고 이젠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야지. 김 서방도 그걸 바라고, 아이들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말야."
경화는 진심을 말하면서도 감추어진 속마음을 차마 드러낼 수 없었다. 명색이 교수가 돼 가지고 엄마 허드렛일 시킨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 같다는 말이 경화의 입에서만 깔끄럽게 맴돌았다.
"허기사 이 일 그만두고 나면 몸뚱이야 편하겠지. 그런데 에미 마음속엔 차마 이 일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엄마에게 있어 청소는 쓸고 닦는 일만은 아냐. 이 에민 삼십 년 동안 이 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해왔어. 아버지도 없이 불쌍하게 자란 내 딸이 순탄하게 제 갈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빌었던 간절한 기도였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쓸고 닦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흉하게 붙어 있는 껌을 뜯어내며 인상 한번 쓰지 않았어. 남들 걸어가는 길 깨끗하게 해놔야, 내 자식 걸어갈 길 순탄할 거라고 믿으면서….'
차마 엄마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서, 곰팡이 핀 벽만을 바라보던 경화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엄마, 내가 괜한 말을 했지?"
"아니다. 네 마음 다 안다. 학교에서 엄마와 마주칠 때 네가 창피해 할까 봐 엄마는 내심 걱정되기도 했는데, 늘 달려와서 에미 손을 잡아주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창피하기는, 엄마가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엄마는 꺼칠꺼칠한 손을 뻗어 딸의 얼굴을 쓰다듬어주었다.
"에미는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지난번 교수식당에서 너랑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데 어찌나 낯설고 어색하던지…. 어엿한 교수님이 내 딸이라는 게 믿어지질 않더구나. 고개도 못 들고 에미가 밥 먹을 때, 너는 음식이 맛있어 코 박고 먹는 줄 알았겠지만, 지나간 세월이 고마워서 눈물 감출 길이 없어 그랬다. 때론 서러움까지 당해야 했던 곳에서 내 딸이 어엿한 교수가 됐다는 것이 하도 고마워서 말야. 걸레질을 하다가 물이라도 조금 튀는 날이면 사납게 쏘아붙이고 가는 여학생들을 그저 웃음으로 흘려 보낼 때, 에미 심정인들 좋았겠냐. 그래도 쓴 인상 한번 보내질 않았다. 그래야 내 자식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지금은 네가 학생들 가르치는, 더 책임있는 일을 하는데 내가 어찌 이곳을 떠날 수 있겠냐. 무지랭이 에미가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말이다…."
경화는 엄마를 가슴에 꼬옥 끌어안았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고마워. 엄마를 보면 반딧불이 생각나. 야윈 몸 한 켠에 꽃등을 매달고 깜박깜박 어둠을 밝혀주는 반딧불이 말야. 엄마의 속 깊은 마음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 엄마, 어제 우리 과科 교수님들 회식이 있었거든. 강남에 있는 일식집에서 했는데, 식사비가 얼마나 나왔는 줄 알아. 한 사람당 십만원 해서 육십만원이 넘게 나왔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서럽더라구. 우리 엄마는 새벽 다섯 시 반이면 집을 나와, 삼십년 동안 눈비 맞으며 고작 받는 한 달 월급이 육십오만 원인데,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더라구. 2000년도에 월급 육십오만 원 받는다면 누가 믿겠어. 그래서 엄마한테 이런 말했던 거야. 미안해, 엄마."
"미안하긴. 엄마가 늘 너한테 미안하지."
엄마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경화는 엄마 품에 안겨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소리 없이 엄마에게 말했다.
'어머니, 당신은 삼십 년 동안이나 어두운 새벽버스에 지친 몸을 실으셨습니다. 낡은 청소복에 아픈 허리 깊이 감추고 늘 바보처럼 웃으셨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저를 밝혀주었습니다. 반딧불이처럼 환한 불빛으로 반짝이고 싶어하는 철없는 딸을 위해 당신은 더 짙은 어둠이 돼주셨습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저 지금 좀 눈물이 나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지금보다 더 철이 없던 시절... 저로 인해 두 분이 흘리신 눈물이 생각이 나서 말입니다.
내일 있을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때문에 어제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밤을 새웠더니 몸이 조금 피곤합니다.
요즘은 하루 밤 새우는 것도 힘이 듭니다.
전에는 진짜 속된 말로 밥먹듯이 밤을 새웠는데...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날이 더 춥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 데워 마셔야겠습니다.
그럼... 포근한 저녁 되세요.
당신의 이웃이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참아내는 인내요.
추문이 들릴 때 못 들은 척 귀를 막아버리는 일이요.
다른 사람의 재난에 동정을 베푸는 일이며,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을 미루지 않고 즉시 행하는 일이요.
불행이 닥치면 용기를 갖는 일이다.
구세군의 모금함도 그렇고, 산타Santa의 옷 색깔도 그렇고, 12월의 상징들은 대체로 붉은 것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연인들의 사랑은 핑크빛 소문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비해, 자선과 마지막이라는 말을 수만 번 듣게 되는 12월은 온통 붉은 것들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와 무엇을 나눈다는 것은 왜 붉게만 보일까요?
애절한 사랑도 겨우 핑크빛으로 보이는데....
그건, 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뼈아픈 후회와 처절한 눈물을 흘린 자만이 갖게 되는 핏빛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숨막히는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침묵과, 인내와 동정과 본분과 용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철환'의 <연탄길>시리즈를 읽다보면 마음을 찡하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와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반딧불이
가을바람이 우수수 낙엽을 몰고 다녔다. 은행나무의 긴 그림자가 교수실 안으로 해쓱한 얼굴을 디밀더니, 조롱조롱 얼굴을 맞댄 노란 은행잎들이 경화 눈에 정겹게 들어왔다. 경화는 기말고사 시험지를 채점하다말고 우두커니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신기루처럼 환한 대학시절의 추억들이 경화의 마음속으로 성큼 다가왔다. 모교의 교수가 된 경화에게 지난 기억들은 언제나 유쾌한 아픔이었다.
경화가 대학시절 퀭한 눈으로 중앙도서관을 오갈 때면 늘 마주치던 청소부 아줌마가 있었다. 몽당비만한 몸으로 이곳 저곳을 오가며 분주히 청소하던 아줌마. 개미떼 같은 기미가 앉은 아줌마의 얼굴엔 한겨울에도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청소부 아줌마를 만나면 경화는 항상 반가운 얼굴로 다가갔다.
"아줌마, 오늘도 또 만났네요. 아줌마도 반갑지요?"
"그럼요. 반갑고말고요."
"아줌마께 여쭤볼 게 있어요. 어떻게 아줌마 얼굴은 언제 봐도 맑게 개어 있지요?"
아줌마는 빙그레 웃으며 결린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거야, 희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대학 다니는 딸이 어찌나 착하고 열심히 공부하는지, 딸에만 생각하면 허리 아픈 것도 다 잊어 버려요."
"대학 다니는 딸은 얼굴이 예쁜가요?"
"그럼요. 예쁘고말구요."
"딸의 이름이 뭔데요?"
"이름은 경화구, 성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스꽝스런 대화를 주고받은 뒤, 두 모녀는 까르르 웃곤 했다. 청소부 아줌마는 바로 경화 어머니였다. 경화는 마음 아픈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청소하는 엄마를 만나면 늘 그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었다. 엄마를 대신해 걸레질을 할 순 없었지만, 열람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크고 작은 휴지들이 경화의 손에 언제나 가득했다.
대학시절을 회상하던 경화는 문득 시계를 봤다. 그리고 서둘러 교수연구실을 나섰다. 경화는 엄마가 있는 행정관 지하 보일러실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엄마는 비좁고 궁색한 방 한구석에서 낡은 수건을 줄에 널고 있었다.
"우리 딸, 아니 민 교수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그냥…."
"왜, 속상한 일이라도 있는 거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럼 다행이구. 근데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실은 엄마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경화는 허공에 시선을 둔 채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있잖아, 청소일 그만두면 안 돼?"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몸뚱이가 아직 성한데, 왜 일을 그만둬."
"엄마 나이도 있고, 허리도 무릎도 많이 아프잖아."
"나야, 이날까지 청소일로 이골이 났는걸 뭐. 하루 이틀 허리 아픈 것도 아니고. 허긴 네가 학생들 가르치는 대학에서 엄마가 청소일을 하는 게 창피스러울까 봐, 그 생각을 안 해본건 아냐. 너, 혹시 그래서 그러는 거냐?"
"그런 거 아냐. 엄마."
"그런 거 아니면 됐다."
경화는 속마음을 들켜버린 듯 엄마의 물음에 당황한 빛을 보였다. 사실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내에서 청소일을 하는 엄마가 경화의 마음엔 무거운 돌처럼 매달려 있었다.
"경화야, 엄마가 청소일 한 지 얼마나 됐는 줄 아니?"
"나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얼마나 된 걸까?"
"벌써 삼십 년이나 됐다. 너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내 뼈마디 마디를 다 묻은 곳을 떠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아파 누워 있는 어린 너를 방에 두고 새벽버스를 타고 나와야 하는 에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데…. 그런 날이면 하루종일 눈물만 닦으며 일한 적도 많았었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하는 엄마의 얼굴은 깊은 회한에 잠겨 있었다.
"이제는 엄마가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잖아. 엄마도 봉천동 집에 혼자 계시지 말고 이젠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야지. 김 서방도 그걸 바라고, 아이들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말야."
경화는 진심을 말하면서도 감추어진 속마음을 차마 드러낼 수 없었다. 명색이 교수가 돼 가지고 엄마 허드렛일 시킨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 같다는 말이 경화의 입에서만 깔끄럽게 맴돌았다.
"허기사 이 일 그만두고 나면 몸뚱이야 편하겠지. 그런데 에미 마음속엔 차마 이 일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엄마에게 있어 청소는 쓸고 닦는 일만은 아냐. 이 에민 삼십 년 동안 이 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해왔어. 아버지도 없이 불쌍하게 자란 내 딸이 순탄하게 제 갈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빌었던 간절한 기도였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쓸고 닦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흉하게 붙어 있는 껌을 뜯어내며 인상 한번 쓰지 않았어. 남들 걸어가는 길 깨끗하게 해놔야, 내 자식 걸어갈 길 순탄할 거라고 믿으면서….'
차마 엄마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서, 곰팡이 핀 벽만을 바라보던 경화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엄마, 내가 괜한 말을 했지?"
"아니다. 네 마음 다 안다. 학교에서 엄마와 마주칠 때 네가 창피해 할까 봐 엄마는 내심 걱정되기도 했는데, 늘 달려와서 에미 손을 잡아주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창피하기는, 엄마가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엄마는 꺼칠꺼칠한 손을 뻗어 딸의 얼굴을 쓰다듬어주었다.
"에미는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지난번 교수식당에서 너랑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데 어찌나 낯설고 어색하던지…. 어엿한 교수님이 내 딸이라는 게 믿어지질 않더구나. 고개도 못 들고 에미가 밥 먹을 때, 너는 음식이 맛있어 코 박고 먹는 줄 알았겠지만, 지나간 세월이 고마워서 눈물 감출 길이 없어 그랬다. 때론 서러움까지 당해야 했던 곳에서 내 딸이 어엿한 교수가 됐다는 것이 하도 고마워서 말야. 걸레질을 하다가 물이라도 조금 튀는 날이면 사납게 쏘아붙이고 가는 여학생들을 그저 웃음으로 흘려 보낼 때, 에미 심정인들 좋았겠냐. 그래도 쓴 인상 한번 보내질 않았다. 그래야 내 자식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지금은 네가 학생들 가르치는, 더 책임있는 일을 하는데 내가 어찌 이곳을 떠날 수 있겠냐. 무지랭이 에미가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말이다…."
경화는 엄마를 가슴에 꼬옥 끌어안았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고마워. 엄마를 보면 반딧불이 생각나. 야윈 몸 한 켠에 꽃등을 매달고 깜박깜박 어둠을 밝혀주는 반딧불이 말야. 엄마의 속 깊은 마음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 엄마, 어제 우리 과科 교수님들 회식이 있었거든. 강남에 있는 일식집에서 했는데, 식사비가 얼마나 나왔는 줄 알아. 한 사람당 십만원 해서 육십만원이 넘게 나왔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서럽더라구. 우리 엄마는 새벽 다섯 시 반이면 집을 나와, 삼십년 동안 눈비 맞으며 고작 받는 한 달 월급이 육십오만 원인데,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더라구. 2000년도에 월급 육십오만 원 받는다면 누가 믿겠어. 그래서 엄마한테 이런 말했던 거야. 미안해, 엄마."
"미안하긴. 엄마가 늘 너한테 미안하지."
엄마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경화는 엄마 품에 안겨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소리 없이 엄마에게 말했다.
'어머니, 당신은 삼십 년 동안이나 어두운 새벽버스에 지친 몸을 실으셨습니다. 낡은 청소복에 아픈 허리 깊이 감추고 늘 바보처럼 웃으셨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저를 밝혀주었습니다. 반딧불이처럼 환한 불빛으로 반짝이고 싶어하는 철없는 딸을 위해 당신은 더 짙은 어둠이 돼주셨습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저 지금 좀 눈물이 나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지금보다 더 철이 없던 시절... 저로 인해 두 분이 흘리신 눈물이 생각이 나서 말입니다.
내일 있을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때문에 어제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밤을 새웠더니 몸이 조금 피곤합니다.
요즘은 하루 밤 새우는 것도 힘이 듭니다.
전에는 진짜 속된 말로 밥먹듯이 밤을 새웠는데...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날이 더 춥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 데워 마셔야겠습니다.
그럼... 포근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