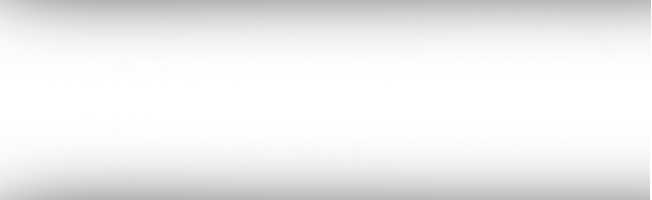신문에서 읽은 MBC 새 월화月火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귀농歸農을 생각하는 것을 보고 생각난 글이 있습니다.
예전에 읽은 <새 한 입, 벌레 한 입, 사람 한 입>中에 나오는 글입니다.
옛날부터 농부가 콩을 심을 때는 세 개씩 심는다. 하나는 하늘을 나는 새의 몫이고, 다른 하나는 땅 속의 벌레들 몫이며, 나머지 하나는 사람이 먹을거리로 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했고, 자연과 나누며 살아가려 했다. 한마디로 공생의 삶을 살아온 것이다.
감나무에서 감을 따도 맨 끝의 것은 새들의 먹을거리로 남겨두었고, 수챗구멍에 허드렛물을 버릴 때도 뜨거운 물은 반드시 식혀서 버려 그곳에 사는 미생물을 죽이지 않았다. 벼를 수확하고 나서도 볏짚을 그대로 밭에 깔아주어 자기 먹을 나락만 빼고는 그대로 다시 흙 속으로 돌려주었다.
한데, 이런 공생적 삶에는 나름대로 지혜로운 실용의 목적도 있었다. 콩알 세 개를 심는다지만, 실제로는 새가 먹고 벌레가 먹는다기보다 세 개를 심어야 싹이 날 때 서로 협력하여 잘 자란다. 높은 곳의 감도 구태여 위험하게 다지 않고 남겨두어 새가 먹도록 하는 자상한 마음의 여유를 가졌고, 뜨거운 물을 버리지 않아 수챗구멍이 썩는 것을 방지하면서 그곳에 사는 작은 뭇 생명들의 소중함도 알았다. 뿐만 아니라 볏짚을 밭에 깔아두면, 햇빛을 차단하여 잡초의 발아를 막으면서 도한 그것이 썩어 좋은 거름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란 벌레와 잡초와의 전쟁이라고들 한다. 참으로 무섭고 어리석은 말이 아닐 수 없다. 잡초와 벌레를 인간의 적으로 여겨 화학무기로나 쓸 수 있는 독한 농약과 제초제를 마구 뿌려대니 전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 독성이 그대로 남아 다시 인간에게 돌아옴에도 여전히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인간처럼 어리석은 존재도 없을 듯하다.
벌레나 잡초는 그 역사가 실로 장구하다. 2억 년이 넘었다는 벌레의 역사에 비해 4만 년 정도 되는 현생 인류의 역사는 순간에 불과하다. 하물며 지구 생명의 역사나 다름없는 식물의 역사와 비교한다면 참으로 찰나일 뿐이다. 그래서 지구에 핵전쟁과 같은 대재앙이 일어나도 벌레와 풀은 살아남는다고 하지 않는가.
실제로 아무리 독한 농약과 제초제를 뿌려대도 벌레와 잡초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내성이 생겨 생명력이 더 강해지니 약의 사용량만 늘어날 뿐이다. 그만큼 인간에게 돌아오는 독성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벌레와 잡초를 이기려는 발상 자체부터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애초부터 그들을 배제하고 인간들만 독차지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다시 옛날 우리 조상들의 공생의 지혜와 삶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생의 삶이란 자연의 순환 이치를 앎으로써 가능하다. 순환은 생태계의 먹이사슬과 같다. 먹이사슬에는 절대 강자란 없다. 서로 먹고 먹히면서 그런 관계를 순환적으로 이어가며 공생의 삶을 누린다. 약육강식이라고 하지만 절대 한 종을 멸종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적당히 자기 먹을 것만 취하면서 또한 누군가에게 먹힐 줄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생태계의 먹이사슬은 강자생존强者生存이 아니라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고 한다.
순환의 먹이사슬엔 쓰레기란 없다. 자기 먹을 것말고는 모두 다 자연으로 되돌리는 까닭이다. 하다 못해 똥조차도 미생물의 먹이가 되게끔 한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인간의 입으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자기 똥을 3년 동안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했다.
IMF가 가져온 영향으로 '귀농 열풍'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 그 당시 부모님의 도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주위의 많은 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정말 歸農을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 쉬워 歸農이지, 그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 또 느낍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힘든 일 한 번 해보지 않고 펜대만 잡고 있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어떨지... 님들도 눈에 보이죠.
그 중에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도시사람을 위한 주말농사 텃밭 가꾸기>中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작물도 사람 못지 않은 생명체임을 깨달을 수 있다. 그들도 잠자고 먹고 싸고, 즐거워할 줄 알고 괴로워할 줄도 알며 2세를 낳기 위해 열심히 생명활동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소중한 생명체에게 인간의 욕심으로 농약이나 제초제 같은 독약을 뿌려댄다면 사람은 생명력도 없는 거짓 곡식을 먹게 되고 결국 작물은 언젠가 인간을 멀리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맞는 말입니다. 사무실 주위의 공원을 시간이 날 때마다 가볍게 산책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생명'이란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 모를 잡초와 벌레들...
요 몇 일 숨쉬기가 곤란하고 산책하기가 힘들 정도로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호흡기 질환 조심하시구요... 나이 어린 조카들이 걱정이 되네요.
요 놈들 공기 나쁜 것에는 상관없이 뛰어다닐텐데...
그럼... 편안하고 행복한 생각만 하는 밤 되세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예전에 읽은 <새 한 입, 벌레 한 입, 사람 한 입>中에 나오는 글입니다.
옛날부터 농부가 콩을 심을 때는 세 개씩 심는다. 하나는 하늘을 나는 새의 몫이고, 다른 하나는 땅 속의 벌레들 몫이며, 나머지 하나는 사람이 먹을거리로 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했고, 자연과 나누며 살아가려 했다. 한마디로 공생의 삶을 살아온 것이다.
감나무에서 감을 따도 맨 끝의 것은 새들의 먹을거리로 남겨두었고, 수챗구멍에 허드렛물을 버릴 때도 뜨거운 물은 반드시 식혀서 버려 그곳에 사는 미생물을 죽이지 않았다. 벼를 수확하고 나서도 볏짚을 그대로 밭에 깔아주어 자기 먹을 나락만 빼고는 그대로 다시 흙 속으로 돌려주었다.
한데, 이런 공생적 삶에는 나름대로 지혜로운 실용의 목적도 있었다. 콩알 세 개를 심는다지만, 실제로는 새가 먹고 벌레가 먹는다기보다 세 개를 심어야 싹이 날 때 서로 협력하여 잘 자란다. 높은 곳의 감도 구태여 위험하게 다지 않고 남겨두어 새가 먹도록 하는 자상한 마음의 여유를 가졌고, 뜨거운 물을 버리지 않아 수챗구멍이 썩는 것을 방지하면서 그곳에 사는 작은 뭇 생명들의 소중함도 알았다. 뿐만 아니라 볏짚을 밭에 깔아두면, 햇빛을 차단하여 잡초의 발아를 막으면서 도한 그것이 썩어 좋은 거름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란 벌레와 잡초와의 전쟁이라고들 한다. 참으로 무섭고 어리석은 말이 아닐 수 없다. 잡초와 벌레를 인간의 적으로 여겨 화학무기로나 쓸 수 있는 독한 농약과 제초제를 마구 뿌려대니 전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 독성이 그대로 남아 다시 인간에게 돌아옴에도 여전히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인간처럼 어리석은 존재도 없을 듯하다.
벌레나 잡초는 그 역사가 실로 장구하다. 2억 년이 넘었다는 벌레의 역사에 비해 4만 년 정도 되는 현생 인류의 역사는 순간에 불과하다. 하물며 지구 생명의 역사나 다름없는 식물의 역사와 비교한다면 참으로 찰나일 뿐이다. 그래서 지구에 핵전쟁과 같은 대재앙이 일어나도 벌레와 풀은 살아남는다고 하지 않는가.
실제로 아무리 독한 농약과 제초제를 뿌려대도 벌레와 잡초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내성이 생겨 생명력이 더 강해지니 약의 사용량만 늘어날 뿐이다. 그만큼 인간에게 돌아오는 독성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벌레와 잡초를 이기려는 발상 자체부터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애초부터 그들을 배제하고 인간들만 독차지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다시 옛날 우리 조상들의 공생의 지혜와 삶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생의 삶이란 자연의 순환 이치를 앎으로써 가능하다. 순환은 생태계의 먹이사슬과 같다. 먹이사슬에는 절대 강자란 없다. 서로 먹고 먹히면서 그런 관계를 순환적으로 이어가며 공생의 삶을 누린다. 약육강식이라고 하지만 절대 한 종을 멸종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적당히 자기 먹을 것만 취하면서 또한 누군가에게 먹힐 줄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생태계의 먹이사슬은 강자생존强者生存이 아니라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고 한다.
순환의 먹이사슬엔 쓰레기란 없다. 자기 먹을 것말고는 모두 다 자연으로 되돌리는 까닭이다. 하다 못해 똥조차도 미생물의 먹이가 되게끔 한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인간의 입으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자기 똥을 3년 동안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했다.
IMF가 가져온 영향으로 '귀농 열풍'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 그 당시 부모님의 도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주위의 많은 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정말 歸農을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 쉬워 歸農이지, 그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 또 느낍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힘든 일 한 번 해보지 않고 펜대만 잡고 있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어떨지... 님들도 눈에 보이죠.
그 중에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도시사람을 위한 주말농사 텃밭 가꾸기>中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작물도 사람 못지 않은 생명체임을 깨달을 수 있다. 그들도 잠자고 먹고 싸고, 즐거워할 줄 알고 괴로워할 줄도 알며 2세를 낳기 위해 열심히 생명활동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소중한 생명체에게 인간의 욕심으로 농약이나 제초제 같은 독약을 뿌려댄다면 사람은 생명력도 없는 거짓 곡식을 먹게 되고 결국 작물은 언젠가 인간을 멀리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맞는 말입니다. 사무실 주위의 공원을 시간이 날 때마다 가볍게 산책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생명'이란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 모를 잡초와 벌레들...
요 몇 일 숨쉬기가 곤란하고 산책하기가 힘들 정도로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호흡기 질환 조심하시구요... 나이 어린 조카들이 걱정이 되네요.
요 놈들 공기 나쁜 것에는 상관없이 뛰어다닐텐데...
그럼... 편안하고 행복한 생각만 하는 밤 되세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